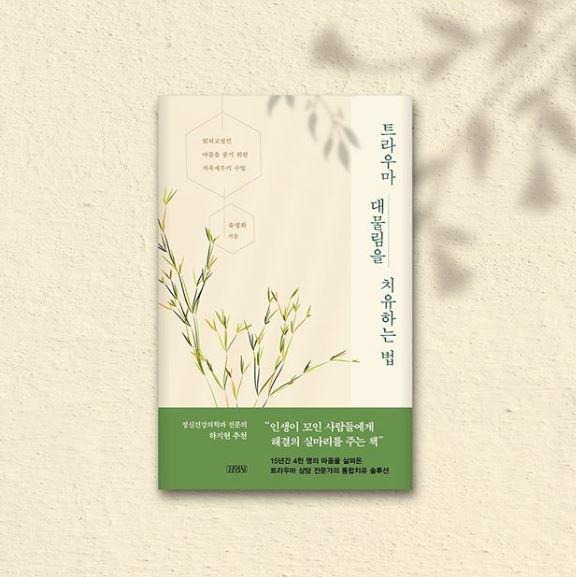검색결과 리스트
InnerMind에세이에 해당되는 글 26건
- 2011.06.17 말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글
말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교과서를 분석하는 숙제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말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립니다.
소통하는 말, 억압하는 말 - 서정오
옛이야기 한 자리.
옛날에 어떤 농사꾼이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큰 기와집에 들어가 하룻밤 재워 달랬것다. 집주인은 글깨나 읽은 벼슬아치인데, 재워 달라는 사람 재워는 안 주고 종이에 글자 석 자를 쓱쓱 써서 눈앞에 들이미는구나.
“자, 읽어 보게나. 이게 다 무슨 잔가?”
들여다보나 마나 뭐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지. 평생 땅만 파먹고 산 농사꾼이 한자를 알 턱이 있나. 입맛만 쩍쩍 다시고 있으니 벼슬아치 하는 말이,
“이건 하늘 ‘천’ 자고, 이건 임금 ‘군’ 자고, 이건 아비 ‘부’ 잔데, 사람이 하늘, 임금, 아비도 몰라봐서야 어찌 사람이라 하겠나. 우리 집에는 사람만 재우지, 사람도 아닌 것은 못 재우네.”
이러거든.
농사꾼이 그 말을 듣고 벼슬아치한테 되물었것다.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겠소이다. 빨갛고 예쁘고 말랑말랑한 자는 무슨 자요? 해와 함께 나왔다가 구름과 함께 들어가는 자는 무슨 자요? 비 오는 날 도롱이 쓰고 논에 들어가는 자는 무슨 자요?”
“엥?”
벼슬아치가 그만 말문이 꽉 닫혀서 입만 실룩실룩하고 있으니 농사꾼이 심드렁하게 하는 말이,
“그래, 그걸 모른단 말이오? 빨갛고 예쁘고 말랑말랑한 자는 오미자요, 해와 함께 나왔다가 구름과 함께 들어가는 자는 그림자요, 비 오는 날 도롱이 쓰고 논에 들어가는 자는 논임자요.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서야 어디 사람이라 하겠소? 나는 사람 집에서나 자지, 사람도 아닌 것 집에서는 안 자오.”
하고서는 제 갈 길로 가더라는 이야기.
세상에는 두 가지 말이 있다. 하나는 벼슬아치의 말이요, 하나는 농사꾼의 말이다. 벼슬아치의 말은 일부러 품을 들여 배워야 하는데, 배우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다. 배운 사람은 알지만 못 배운 사람은 모르는 말이며, 일상의 입말에는 잘 쓰이지 않고 격식을 갖춘 글을 쓸 때나 가끔 쓰인다. 대개는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 말이나 서양 말이고, 보통 백성들보다는 남을 다스리는 사람, 남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 아는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 힘센 사람들이 남을 억압하기 위해 즐겨 쓰는 말이 이것이다.
농사꾼의 말은 일부러 배우지 않아도 삶 속에서 저절로 깨치게 되는 말이다.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이다. 남의 윗자리에서 호령하는 말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서로 소통하려고 주고받는 말이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많이 쓰며, 일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말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들도 즐겨 쓴다.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자. 농사꾼이 한자를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에 농사꾼이 벼슬아치 말을 듣고 잔뜩 주눅이 들어 “나는 하늘, 임금, 아비도 모르니 정말 사람도 아닌가 봐.” 하고 숨을 곳을 찾았다면, 그 순간 그 마음은 벌써 남의 종이 되어 버렸을 것이다. 떳떳하게 “뭐가 어때서?” 하고 말하면서 농사꾼은 비로소 자유인이 되었다.
벼슬아치는 자기만 아는 글자를 농사꾼이 모른다고 해서 서슴없이 그를 모욕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남이 자신을 닮지 않았다고 모욕할 권리는 없다. 그 야만스러움에 맞서기 위해 농사꾼은 자신의 말을 내놓았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말은 농사꾼의 것만은 아니다. 농사꾼의 ‘오미자, 그림자, 논임자’는 말하자면 벼슬아치의 횡포에 앙갚음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을 ‘피장파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생각을 넓게 + 생각을 깊게
벼슬아치의 말은 종종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틀리다’와 ‘고치다’라는 말을 익혀 쓴다. “틀린 것 고쳐 주세요.”와 같이. 그런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똑같은 뜻을 가진 ‘오류’와 ‘수정’이라는 낱말을 새로 배우게 된다. “오류를 수정하라.”와 같은 이런 말은 일상에서 입말로는 거의 쓰지 않는데 시험을 치르거나 논문을 쓸 때는 필요하게 되므로 버릴 수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무식하다고 깔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이다. ‘미루다’를 익히고 나서 ‘유예’라는 말을 배우고, 또 ‘모라토리움’이라는 말을 겹으로 배워야 하는 것도 보기로 들 수 있겠다.
벼슬아치의 말과 농사꾼의 말은 그 노리는 바와 느낌도 아주 달라서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소통과 억압, 타이름과 윽박지름이 뚜렷이 갈린다.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말은 그냥 알리고 타이르는 말 같지만, “출입 엄금”이라는 말은 왠지 눈을 부라리며 윽박지른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 “시끄럽게 굴면 안 돼요.” 하는 말을 들으면 웃으며 “알았어요.” 하고 대답할 만하지만, “소란 행위 엄단”이라는 말 앞에서는 얼굴이 굳어지고 어깨가 움츠러지는 것이다. 듣는 사람 처지에서는 존중과 복종, 알아들음과 뜬금없음으로 가를 수도 있는데, 예컨대 “함께해요.”라는 말 속에는 존중과 권유의 뜻이, “동참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복종과 강요의 뜻이 들어 있음 직하다. “생각을 바꿔 봐요.”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라고 하면 뜬금없이 멍해지는 것도 같은 이치다.
내가 초등학교에 갓 들어갔을 때 어떤 덩치 큰 남자 선생님은 조무래기들 앞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주목!” 하고 말했다. 그런 말을 들어 봤을 리 없는 우리는 화들짝 놀라서 두 주먹을 꼭 쥐었다. 선생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지만 그 뒤로도 그 아리송한 구령을 “다. 여길 보렴.”으로 고치지는 않았다. 교장 선생님은 조회 때마다 우리를 보고 엄숙한 목소리로 “제군들!” 이라고 말했다. 물론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그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자신을 더 잘 따를 것이라 믿었던 것일까.
말을 억압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지 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권위 있고, 그래서 듣는 사람을 얼마나 기죽일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말, 딱딱한 말, 엄격한 말을 즐겨 쓴다.
굳게 믿거니와, 벼슬아치의 말이 농사꾼의 말을 잠시 잠깐 깔볼 수는 있어도 그것을 아주 금 밖으로 내몰지는 못할 것이다. 농사꾼 스스로 종 되기를 거부하고 자유인으로 남고자 하는 한은.
출처 - 창비 출판사
'InnerMind에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호오포노포노 모르나 기도문 mp3 파일로 들어 보세요. - 정화를 경험 합니다. (0) | 2011.02.20 |
|---|---|
| 매 순간의 소중함 (0) | 2011.02.10 |
| 감동적이네요. (0) | 2011.02.03 |
| 저 TV에 나왔어요. - 직장인 회식문화와 관련한 인터뷰 ........ (0) | 2011.01.31 |
| 진짜와 가짜 (0) | 2010.10.06 |